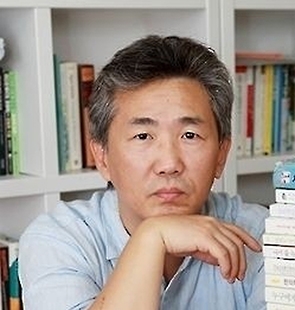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이다.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의 문제점이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불평등 사회가 인간을 파괴하여 국가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한국은 집단 혹은 계급 간 불평등만이 아니라 개인 간 불평등도 심각한 사회이다. 집단 간 그리고 개인 간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집단 간 서열사회, 개인 간 서열사회로 귀착된다. 불평등의 필연적 결과인 서열사회는 다층적 서열을 통해 인간의 역량을 파괴한다. 서열이 인간 역량을 박탈하는 현상은 서열이 낮을수록 심각하다. 예를 들면 서열사회에서는 더 낮은 서열에 있는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하락한다.
세계은행 연구자들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의 10~1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아이들의 카스트를 드러나지 않게 했을 때에는 서열의 높음과 낮음이 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카스트를 드러나게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하자 카스트가 낮은 아이들의 점수가 현저하게 낮아졌다.(마멋, 마이클 지음/김승진 역, 『건강 격차』, 2017, 동녘, 216쪽) 서열을 공개했을 때 낮은 서열 아이들의 점수가 크게 하락한 것은 자신의 낮은 서열로 인해 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나 존중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평가 불안이나 존중 불안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는 불평등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역량이 낮아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역량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조적 능력이나 잠재력은 단지 서열이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서열이 낮은 사람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서열이 높은 사람은 소수이지만 서열이 낮은 사람은 다수다. 따라서 서열이 사람들의 힘과 역량을 파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창조적 능력과 잠재력 파괴로 귀결된다.
불평등 사회는 적성이나 재능을 살릴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인간의 역량을 파괴한다. 고립적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이 심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성에 맞는 일, 자신의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기 힘들다. 생존 문제로 인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계발하지도 못한다.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은 흔히 ‘저한테는 아무 재능도 없어요’, ‘저는 정말 잘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라고 말하곤 한다. 그렇지만 재능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존재할 뿐이다. 자신의 적성이나 재능을 발견하려면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하고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어려서는 오직 입시공부만 허용되고, 커서는 돈 잘 버는 일만 하도록 강요하는 한국 사회는 사람들에게 이런 열린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자신의 잠재력이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없고 계발할 수도 없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삶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젊은이들을 대부분 공무원, 교사, 대기업 직원 같은 특정 직업만을 지망하도록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역량을 파괴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의 역량을 파괴하는 자살행위다.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유일 패권국 지위를 누리던 미국이 급속히 몰락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과학기술 경쟁에서의 패배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이미 실전 배치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아직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군사 분야 과학기술이 북중러 같은 나라들보다 뒤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미국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하지 않고 있어서다.
불평등 사회는 사회를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듦으로써 사람들을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이기주의자가 되도록 강요한다. 불평등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이기주의적인 청년들은 이웃이나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며, 국가나 민족을 위해 노력하거나 헌신하게 해주는 애국심도 없다. 그들은 오직 돈이 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미국이 신자유주의화되던 1980년대를 기점으로 오직 돈이 되는 직업으로만 몰려들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총명한 젊은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에 관심이 있었다. … 그러나 금융 위기가 일어나기 여러 해 전부터 미국 최고의 인재들은 금융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고,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다. 수많은 인재들이 금융업에 몰려 있으니 그 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뜻밖의 일이 아니다.(스티글리츠, 조지프 지음/이순희 역, 『불평등의 대가』, 2013, 열린책들, 207쪽)
우리는 앞으로 중국과 인도와 경쟁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춘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충분히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다. 20세기 말에 우리에게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소라는 명성을 안겨준 기초학문 연구에 대한 투자는 중단되었다. (위의 책 『거대한 불평등』, 75쪽) <계속>
* * *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