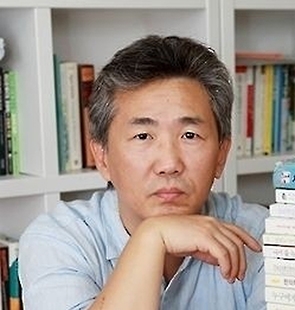한국은 수십 년째 자살률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살 공화국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자살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회피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나 노력을 거의 포기하거나 체념한 듯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인지 2025년 8월 17일 는 「자살방치사회 1편 : 망각한 자살률 1위 오명」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국민 34만여 명이 자살했다. 매년 1만 1000여 명 꼴이다. 지난해에는 36분마다 1명씩 자살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자)이 20명 밑으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유일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20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 2025.8.17.)
통계청이 발표한 ‘연도별 자살률 추이’에 의하면 한국의 자살률은 1995년 10명, 2003년 20명, 2009년에 30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자살률은 지난 30년간 지속해서 높아졌고 2011년에 31.7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의 잠정 자살률은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8.3명으로 2013년(28.5명) 이후 11년 만에 28명을 넘어섰다. 1994년 이후의 30년간 자살자는 33만 9035명인데, 이것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5곳(인천 강화군, 강원 홍천군, 강원 삼척시, 전남 고흥군, 충남 부여군)의 지난달 말 인구 합계(31만 5702명)보다 2만 3333명이나 많은 수치다.
한국에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소도시 하나가 소멸할 정도로 자살자의 수가 많았고 지금도 하루에 평균 40명, 36분마다 1명씩 자살(지난해 자살자는 1만 4439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해 애써 회피하거나 외면하면서 거의 자포자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살률은 삶의 질 저하, 특히 고립적 생존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7년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2002년의 신용카드 대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후 1~2년간 자살률이 크게 높아졌다. 2020~2022년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3년과 2024년에도 자살률이 상승했다. 이런 통계는 자살률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 사회가 자살 문제에 손을 놓은 결과 한국에서 자살은 주요 사망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자살은 20년 넘게 암과 심장질환, 폐렴 등과 함께 5대 사망원인 중 하나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 비중이 큰데, 2023년 통계에 의하면 10~3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원인 1위였고 40~50대에서는 2위였다.
한국인들은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워 자살을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 아이를 낳지 않는다. 한국은 2007년과 2012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을 빼고는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4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 24만 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2023년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38개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고 있다(사단법인 기본사회 편집위원회,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 2024, 밀알, 79쪽). 올해의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접하고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법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는 2025년 7월 29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정말 충격적이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며 “숫자가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학자들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자살하는 반면 아이는 낳지 않는 한국을 인구소멸에 의해 멸망할 국가 1순위로 꼽는다.
일단 자녀 양육이나 뒷바라지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나 노력의 문제를 제외하고 말하자면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의 행복도와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돈을 곧 행복으로 보는 물질주의적 행복론을 믿고 있다. 그래서 전 인생을 돈을 버는데 갈아넣지만 (설사 돈을 버는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행복은 더 멀어져만 간다. 한국인들이 행복을 돈에서 찾게 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인간관계 악화다.
한국에서는 개인 간 생존경쟁과 서열경쟁이 전 사회에 일반화된 결과 가족관계도 악화되었다.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한국을 포함하는 17개 선진국의 성인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가족’을 1위로 꼽았지만, 오직 한국만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았다. 이런 결과는 한국의 가족 내 인간관계가 크게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 * *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